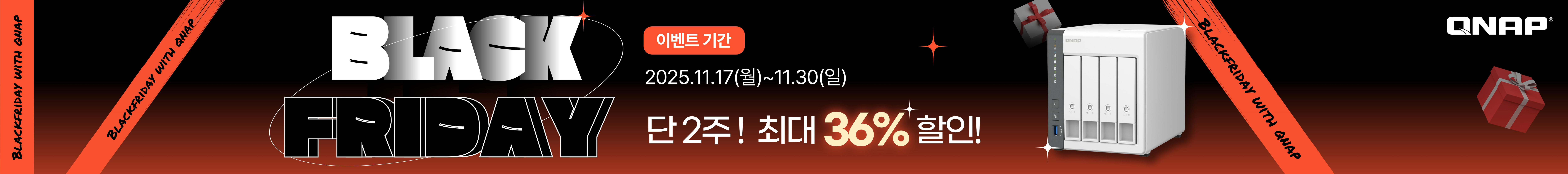[칼럼] 치킨집의 환호보다, 난방비 고지서가 더 현실이다
대장
승인 :
2025-10-31 22:40:33
8
0
치킨집의 환호보다, 난방비 고지서가 더 현실이다
오늘 하루 페이스북이 떠들썩했다. 남부럽지 않은 글로벌 기업 오너 3인이 치킨집에서 소소한 담소를 나눴다는 사진 한 장이 하루 종일 피드를 점령했다. 누구는 “소탈하다”고, 누구는 “국격이 올라갔다”고 박수를 보낸다. 그런데 업계 30년을 보낸 내 눈엔, 그 장면이 도리어 묘한 비현실감으로 다가온다. 왜 그들의 가벼운 맥주잔 부딪힘이 우리 일상의 무게를 덜어준다고 믿는 걸까?
냉정히 말해, 그들이 치킨에 맥주를 더 시키든 안 시키든 우리 통장 잔고의 자릿수는 바뀌지 않는다. 삼성이 반도체를 ‘쏟아’ 팔아도, 재벌 총수 간의 회동이 훈훈한 미담으로 포장돼도, 그 효과가 곧장 동네 자영업자와 중소·중견기업 직원들의 급여명세서로 치환되진 않는다. 그들은 치킨을 뜯는 동안에도 돈이 돈을 낳는 구조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그 구조의 외곽에서 삶을 꾸려간다. 미담의 조명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 보인다.

숫자로 말해보자. 한국 노동시장 전체를 100으로 둘 때, ‘대기업’(통계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대략 한 자리수 남짓이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초거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은 1% 언저리다.
주변 누군가가 “삼성 다닌다”고 하면, 정말로 상위 1% 직장에 들어간 셈이다. 나머지 90%는 300인 미만 사업장과 자영업, 특고·플랫폼 노동, 파견·용역·하청 등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에 흩어져 있다. 뉴스 헤드라인이 올려놓은 평균 임금, 평균 생산성, 평균 성장률은 여기서 착시를 만든다. 특정 지배계층과 초대기업의 고임금이 평균을 끌어올리면, ‘평균보다 아래’에 선 대다수는 체감이 없다. 통계는 평균을 말하고, 삶은 중위값을 견든다.
나는 언론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했다. 그러한 나도 숫자를 믿되, 숫자에 속지 않으려 애쓴다. 데이터가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지난 십수 년간 생산성과 이익은 상층으로 집중됐고, 그 성과가 임금·낙수로 균등 배분된 흔적은 미약하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청-하청의 납품단가 구조, 정규-비정규의 이중노동시장, 플랫폼의 편의 뒤에 숨은 위험의 외주화…. 이 키워드들이 뉴스에서 잠깐 반짝이고 잊힐 때, 현장에선 그게 통장과 고지서의 숫자로 남는다.
겨울이 온다. 실외는 찬바람이 불뿐이지만, 진짜 추위는 난방비 고지서가 도착하는 순간 시작된다. 변동금리로 전세 대출을 안고 있는 30대 가장은 한숨을 또박또박 더하고, 부모 봉양을 병행하는 40·50대는 “혹시라도”를 수십 번 곱씹는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은 연말이 될수록 ‘권고’라는 단어의 온도를 체감한다.
자영업자는 매출표보다 임대료 명세서를 먼저 본다. 예비 대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도, 알바를 뽑겠다는 곳은 이미 실종됐다. 전세사기는 아직 매듭이 풀리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삶은 여전히 경사로를 미끄러진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합리적 포기’로 정의하고, 장년층은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에서 경쟁자를 만난다. 공과금은 ‘이달만 연체’가 다음 달의 습관이 되기 쉽다. 이런 게 우리 90%의 일상적인, 그러나 통계가 잘 포착하지 못하는 ‘애환의 기술적 사양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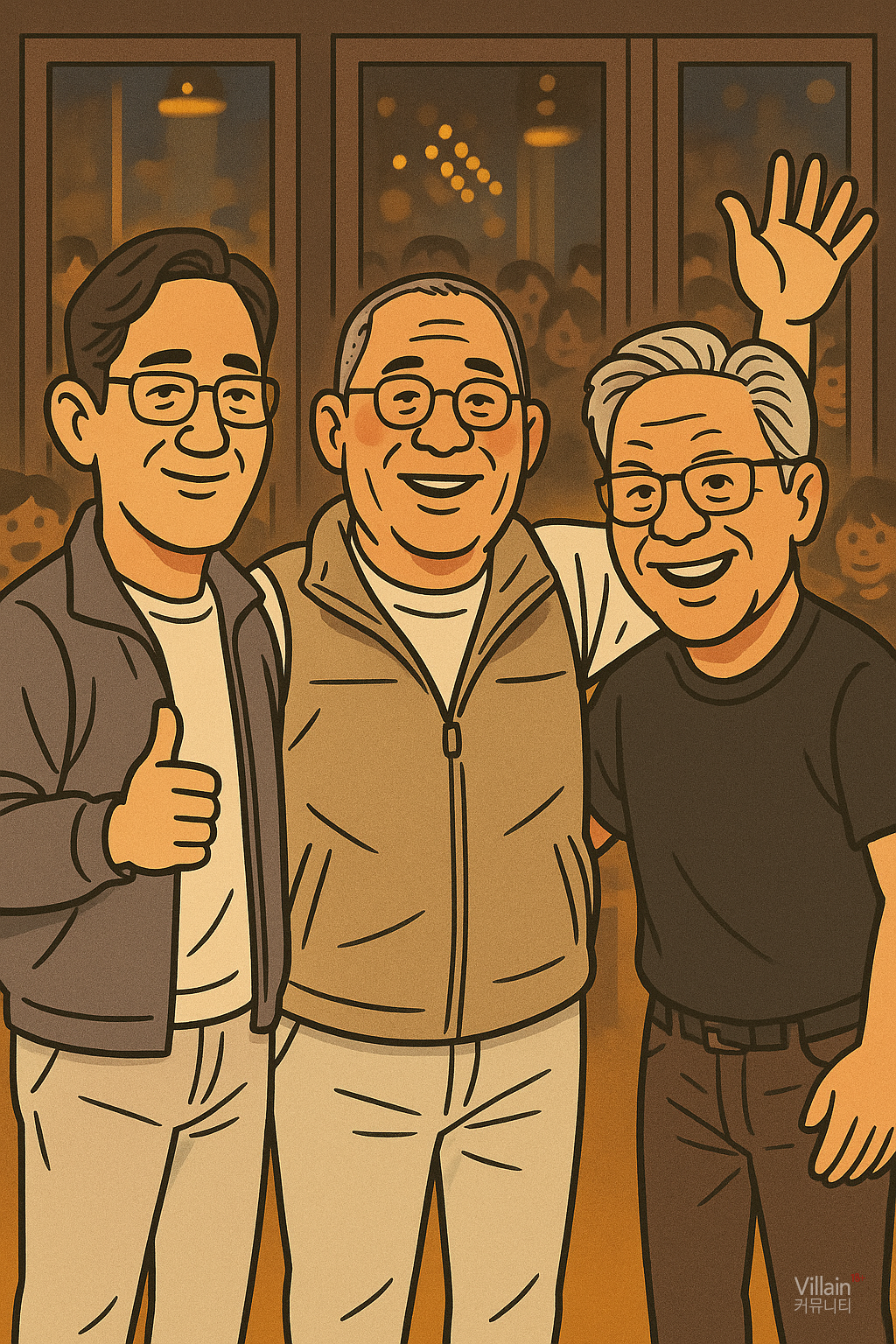
그렇다면 치킨집의 ‘훈훈한 장면’은 왜 그토록 기분 좋은 뉴스가 되는가. 심리적 거리 때문이다. 거대한 구조와 복잡한 제도는 어렵고 멀다. 반면 유명인의 소탈한 모습은 쉽고 가깝다. 우리는 구조 대신 서사를 소비하고, 시스템 대신 장면을 공유한다. 하지만 장면은 장면일 뿐,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환호는 쉽고, 개선은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현실의 리그’로 카메라를 돌려야 한다.
업계에서 30년을 버티며 배운 건 이것이다. 구조를 바꾸는 일은 영웅담이 아니라 공정표와 체크리스트의 문제라는 것. 기술과 자본의 효율이 분배의 정의를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경제의 체감은 대기업 실적 발표가 아니라 가구당 가처분소득과 필수재 가격의 미세한 변동에서 결정된다는 것.
그러니 냉정하고도 구체적으로 묻자. 우리 90%의 오늘을 가볍게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바로 내일부터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떤 이는 말한다. “성공한 사람이 길가에서 똥을 싸 갈겨도 다 이유가 있겠지 하며 합리화한다”고. 나는 다르게 본다. 합리화의 문제라기보다, 대체 가능한 상상력의 빈곤이다. 우리에게는 ‘환호의 장면’ 을 통해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망각'하도록 코드가 짜여 있다. 존재하지만 눈에는 안보이는 제약을 무너뜨려야 똑같은 뉴스가 뜨거운 감탄사가 아니라, 차가운 개선으로 이어진다.
아직도 견고하기에 계속 반복되는 셈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왜 우리는 남의 잔치에 그토록 기꺼이 박수를 치는가. 아마도 우리 자신의 잔치가 드물어서일 것이다. 그러니 박수를 아끼자는 말이 아니다. 다만 박수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자는 말이다. 올겨울 보일러 온도는 낮춰야 하나? 다음 달 월급은 스처만 가겠지! 내년 아이의 학원비는? 찹찹한 현실을 가볍게 해주는 정책과 관행, 회사의 제도 개선과 거래 관행의 업데이트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다.
적어도 그때의 박수는 내 삶에 반향을 일으킨다.
치킨집의 한 장면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저녁 식탁은 여전히 팍팍하다.
게다가 난 저렴하지만 팍팍한 가슴살은 싫다.
가격이 비싸도 닭다리살만 골라 먹고 싶다.
8
0
By 기사제보 및 정정요청 = master@villain.city
저작권자ⓒ 커뮤니티 빌런 18+ ( Villa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포함 금지
관련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Comment
Today Ranking
- 종합
- 뉴스/정보
- 커뮤니티
- 질문/토론
1.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 이렇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다
2.
삼성, Exynos 2600 최초 공개… “조용히 들었고, 핵심부터 다듬었다”는 티저로 메시지 전달
3.
Intel Core Ultra 7 366H, Geekbench에 유출 – iGPU 성능이 Radeon 840M 대비 26%↑
4.
조텍 VIP 멤버십, 12월 맞아 달콤한 제주귤 증정 이벤트 진행
5.
Ai로 만든 광고, 업계비상.
6.
알리 광군제와 블프 때문일까요? 평택세관에 오래 붙들려 있네요.
7.
테슬라 Model 3/Y 중국산 LG NCM811 팩, 심각한 고장률과 압도적으로 짧은 수명
8.
이제 한파 시작인듯 하네요.
9.
‘Windows on ARM 지원 외장 GPU’, 엔비디아·AMD가 아니라 중국 리쑤안일 가능성
10.
테슬라 중국산 LG 배터리, “상태가 catastrophic(재앙적)”…유럽 수리 업체의 주장
1.
삼성, Exynos 2600 최초 공개… “조용히 들었고, 핵심부터 다듬었다”는 티저로 메시지 전달
2.
Intel Core Ultra 7 366H, Geekbench에 유출 – iGPU 성능이 Radeon 840M 대비 26%↑
3.
조텍 VIP 멤버십, 12월 맞아 달콤한 제주귤 증정 이벤트 진행
4.
테슬라 Model 3/Y 중국산 LG NCM811 팩, 심각한 고장률과 압도적으로 짧은 수명
5.
‘Windows on ARM 지원 외장 GPU’, 엔비디아·AMD가 아니라 중국 리쑤안일 가능성
6.
테슬라 중국산 LG 배터리, “상태가 catastrophic(재앙적)”…유럽 수리 업체의 주장
7.
마이크론, 소비자 메모리 사업 철수…"AI 고객에 집중"
8.
최대 96코어 Zen 6 탑재 EPYC Embedded 9006 ‘Venice’, 그리고 Fire Range·Annapurna까지… AMD의 임베디드 로드맵 전면 공개
9.
삼성 OneUI 8.5 전체 변경점 공개… AI·연결성·보안·워치 기능 전반 업그레이드
10.
아이피타임, ipTIME ICC 기능 강화… 네트워크 품질 관리 대시보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