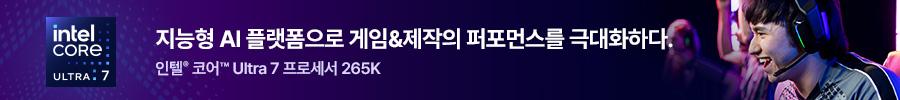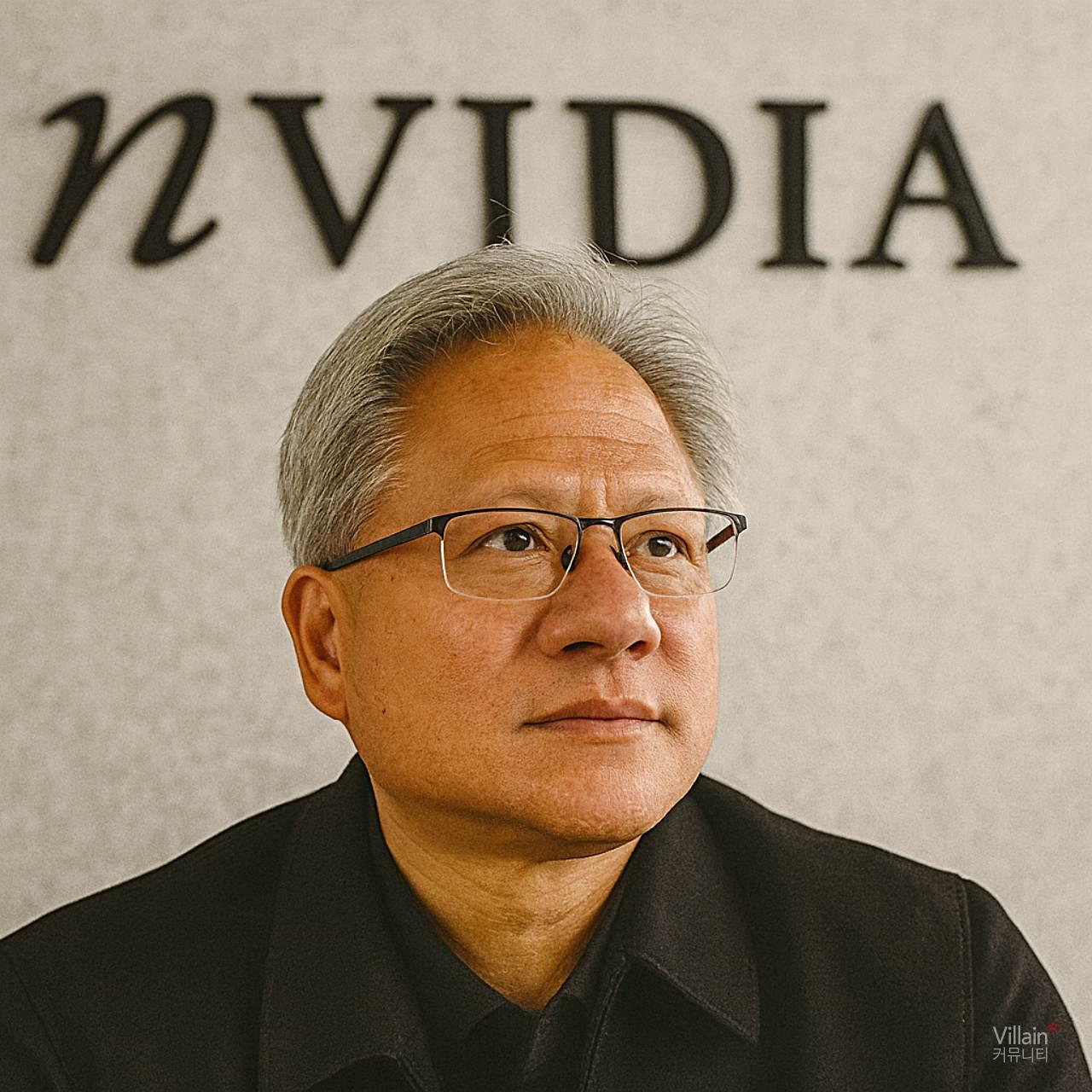엔비디아, 게임에서 인공지능까지 이어진 GPU 서사
승인 :
2025-08-31 05:59:13
1
0
TAG
1
0
By 기사제보 및 정정요청 = master@villain.city
저작권자ⓒ 커뮤니티 빌런 18+ ( Villain ),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포함 금지
관련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Comment